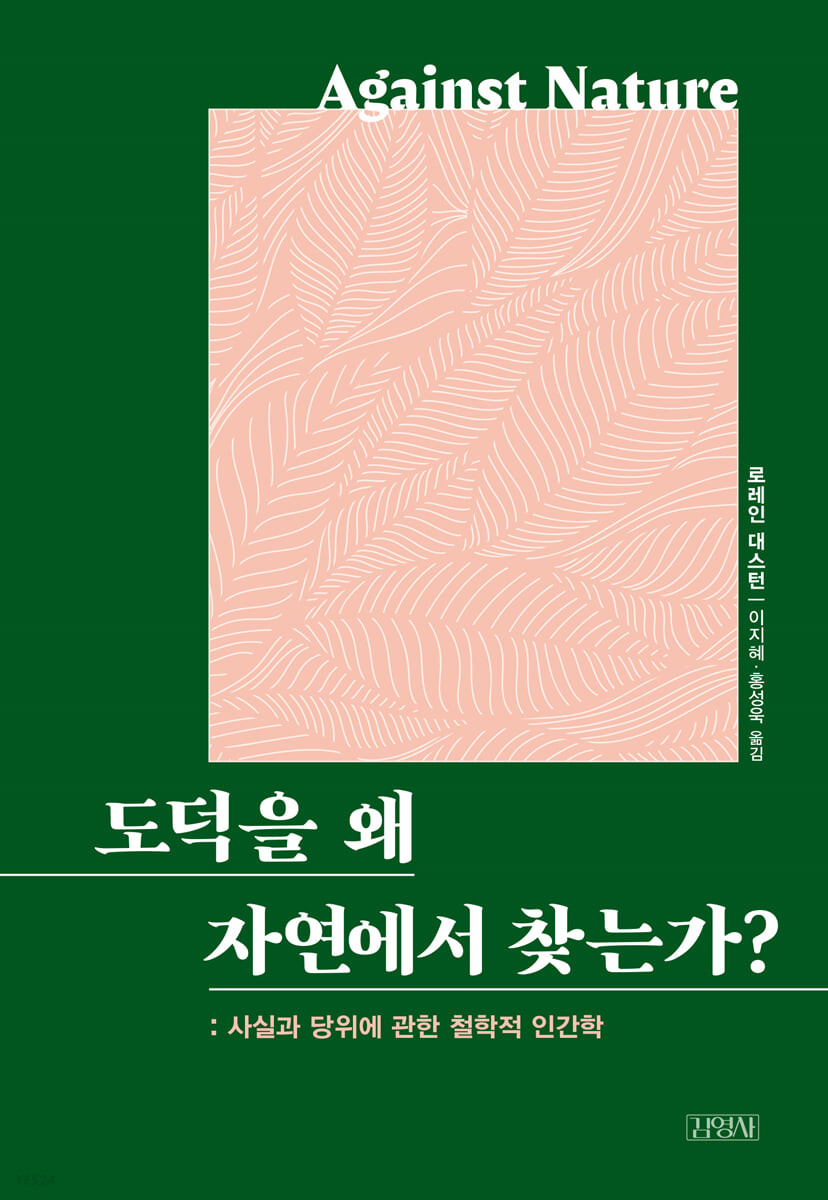로레인 대스턴Lorrraine Daston이 2019년 펴낸 『도덕을 왜 자연에서 찾는가』 (Against Nature)는 인간이 도덕을 자연에서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주장을 펼친다. 기억할만한 내용을 간추려보자면 다음과 같다.
인간이 살아가며 구성하고 따르는 규범은 질서를 전제한다. 이때 자연은 ‘상상가능한 질서의 창고’로서 친숙하게 이용될 수 있다. 자연에는 너무나도 많은 현상, 사물, 생물 등이 있고, 각각에는 일정한 속성과 질서가 있다. 그러므로 이미 자연에 존재하는 질서에 착안하여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질서를 구상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자연의 질서가 훼손되었을 때 인간은 ‘격정’이라는 반응을 보인다. 관련된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대스턴은 인간이 자연을 전형으로 하는 질서를 인식하고 그에 관심 가진다고 설명한다. 요컨대 인간종 특성상, 우리는 자연에서 질서를 찾는 고유한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소위 자연주의적 오류는 사실 오류라기보다 인간의 합리적 사고과정이라는 주장이다.
대스턴은 어떤 규범을 특정한 자연적 질서만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강조한다. 자연에는 무수히 많은 질서가 있어서, 어떤 명제의 찬성 근거로 가져온 자연적 질서에 대하여 또 다른 자연의 질서를 반대 근거로 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규범을 근거짓는 “자연의 유일한 질서”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p.90). 자연에 존재하는 사례를 바탕으로 주장을 정당화하는 것은 논할 가치도 없다 생각하며 그쳤었는데, 그러한 논증이 심지어 효과적이지도 않다는 점도 생각하게게 되었다.
—–2024.12.13 update—–
대스턴의 이 책을 다시금 이해하고 정리해보고자 본문 내용을 살펴보았다. 자연 질서에서 규범을 끌어내는 것을 자연주의적 오류로 불러서는 안된다는 대스턴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결론지어진다:
“1. 자연화naturalization는 사실 비평가들이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약한 전략이다. 모든 규범을 지지하는(또는 전복시키는) 수많은 자연적 질서가 있기 때문이다 (p.89).” “2. 자연에 대한 호소는 근본적으로 자연 질서와 규범성 그 자체의 연관성에 관한 것이지, 어떤 특정한 자연 질서와 어떤 특정한 집합 또는 규범 사이의 연관성에 관한 것이 아니다 (p.90)” “3. 인간의 몸에 딸린 이성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이성이다 (p.92).”
특정한 자연 속 사례로 특정한 규범을 연관시키는 것은 자연의 다양성을 근거로 무력화된다. 다만 자연 질서에서 규범을 연관시키는 것 자체가 인간 이성에 고유하며 합리적인 이상, 이를 자연주의적 오류라고 칭할 수 없다는 것이 대스턴이 주장하는 요지인 것 같다.
1999년 출간된 브루스 배게밀의 『생물학적 풍요』 (Biological Exuberance)라는 책이 2023년에 우리말로 번역되어 나왔는데, 다종다양한 사례를 가진 “상상가능한 질서의 창고”로서의 자연을 여러 예시로 보여주는 것 같아 읽어볼 생각이다.
자연에서 질서를 찾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인간의 합리성이라는 대스턴의 주장을 정말 흥미롭게 읽었다. 자연이 ‘다양한 질서’의 원천이기에 규범에 전제되는 질서의 전형이 될 수 있으며, 바로 그 때문에 어떤 규범을 특정한 자연적 속성 하나만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실패한다는 점이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
*책이 되게 작고 예쁘다!! ^0^